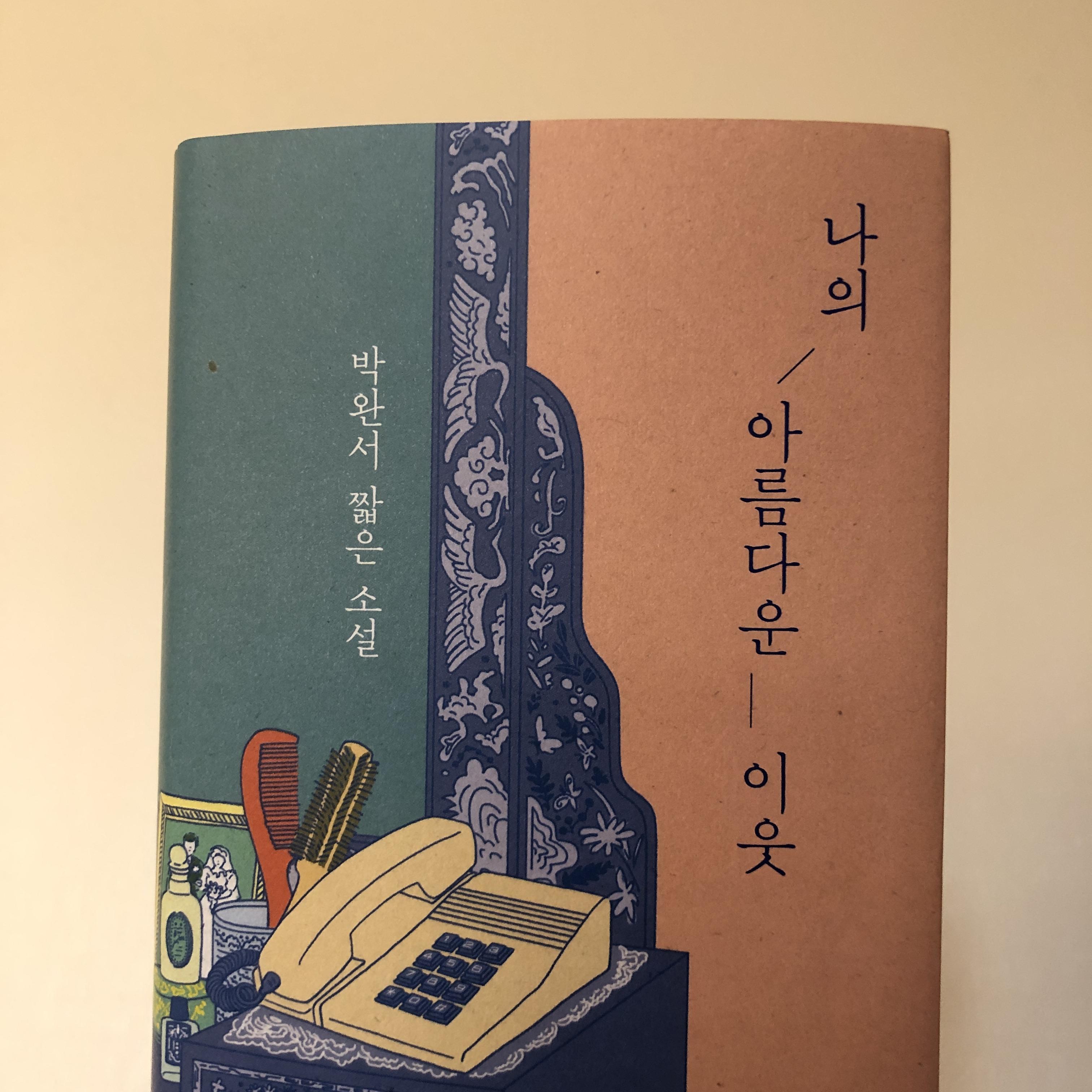
<나의 아름다운 이웃> 박완서
우리 시대의 영원한 이웃, 박완서를 다시 만나는 시간! 박완서 소설가는 한국어로 소설을 읽는 사람이 남아 있는 한, 언제까지고 읽힐 것이다. _정세랑 『나의 아름다운 이웃』은 고(故) 박완서 작가가 처음으로 펴낸 짧은 소설집이자, 1970년대 사회의 단면을 예리하게 담아내고 평범한 삶 속에 숨이 있는 기막힌 인생의 낌새를 포착한 작품이다. 우리에게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, 사랑과 결혼의 잣대란 도대체 무엇이며, 진실이란 우리에게 얼마만 한 기쁨이고 슬픔인지를 작가 특유의 신랄하고도 친근한 문체로 보여준다. 박완서 작가의 장녀이자 수필가이기도 한 호원숙은 이번 책의 「개정판을 펴내며」에서 “재미 속에 쿵 하고 가슴을 흔들어대고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히게 합니다. ……낭만적 사랑의 꿈을 버리지 않으셨던, 그러나 ‘너의 삶의 주인은 너’라고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어머니”라고 회고한다. 짧은 분량의 단숨에 읽히는 이야기지만 여운의 뒷맛은 더 길고 강하다. 자기기만과 허위의식에 찬 속물근성이 까발려진 듯해 뜨끔하고, 목표의식 없이 내달리는 헛헛한 내면이 들킨 것 같아 부끄럽다.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담소를 나누던 이웃 간의 정을 찾아볼 수 없게 된 작금의 사태가 떠올라 씁쓸하고, 그럼에도 놓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감정에는 가슴이 뜨거워진다. 「그때 그 사람」, 「마른 꽃잎의 추억」, 「아직 끝나지 않은 음모」, 「그림의 가위」, 「어떤 유린」 등 48편의 이야기가 실린 이 짧은 소설집은 평생에 걸쳐 선생의 화두였던 ‘사랑과 자유’에 대한 희구를 때론 낭만적으로, 자주 희망적으로 펼쳐 보인다. 사랑과 자유를 꿈꾸는 한 나 자신을 포함한 인간은, 즉 우리의 이웃들은 진정 ‘아름다운’ 존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.
<나의 아름다운 이웃>은 박완서 작가가 1970년대 여러 기업 사보나 신문에 연재했던 단편 소설 엮은 책이다(찾아보니 책에 실린 단편이 마흔 여덟개나 된다고 한다). 지금은 50년이나 지나버린 1970년대의 생활상과 가치관이 너무 과거의 이야기인 것 같다가도 여전히 우리는 비슷한 고민을 가진 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.
단편 <완성된 그림>은 열심히 돈을 모아 땅을 사려했던 부부의 실패담이다. 남편은 열심히 일하고 아내는 알뜰히 살림하며 돈을 모은다. 땅 100평을 사는 것이 그들의 목표다. 하지만 모은 돈으로 땅을 사기에는 부족해 그냥 돌아올 수 밖에 없었다. 그래서 다시 열심히 돈을 모아 갔더니 또 땅값이 올라 땅을 살 수 없었다.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부동산에서 환영하는 것은 부부가 아닌 모피코트를 입은 귀부인들이었던 것이다. 이슬픈 과정을 몇 번 더 반복한 후 지쳐버린 부부는 결국 땅 사는 것을 포기하고 작은 아파트를 구한다. 남편은 옹색한 아파트지만 오랜 친구의 그림 하나를 걸어놓으면 그나마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. 그 친구는 항상 자신의 작품이 미완성이라고 이야기하며 내보이기를 부끄러워했던 친구였다. 그동안 돈 모으고 바삐 사느라 연락이 끊겼지만 우연히 신문에서 친구의 개인전이 열린다는 소식을 보고 ‘드디어 그림을 완성했나보군!’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찾아간다. 그런데 그곳에서 마주한 건 귀부인들에게 아첨하는 마치 부동산 소개업자 같은 친구의 모습이었다. 늘 미완성이던 친구의 그림이 금빛 은빛 액자에 끼워진 ‘완성된 그림’이 되었지만 주인공은 친구의 미완성된 그림과 그 때의 친구가 그리웠다. 더이상 그림을 사고 싶지 않아진 주인공은 그냥 집으로 돌아간다.
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. 먼저 주인공이 맨 처음 부동산을 찾아갔을 때 50평은 살 수 있었는데 왜 사지 않았을까, 반이라도 사놨으면 가격이 많이 올랐을 텐데.. 이런 현실적인 생각을 했다. 예나 지금이나 인플레이션에 대책없이 당하지 않기 위해선 화폐보다는 실물 자산을 준비해야 하는 군, 나는 과연 집을 살 수 있을까, 이러나 저러나 빨리 사는 게 상책이겠지.. 소설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다니 좀 웃겼다. 그만큼 이 소설이 현실적이고 공감되는 이야기라 그런 것 같다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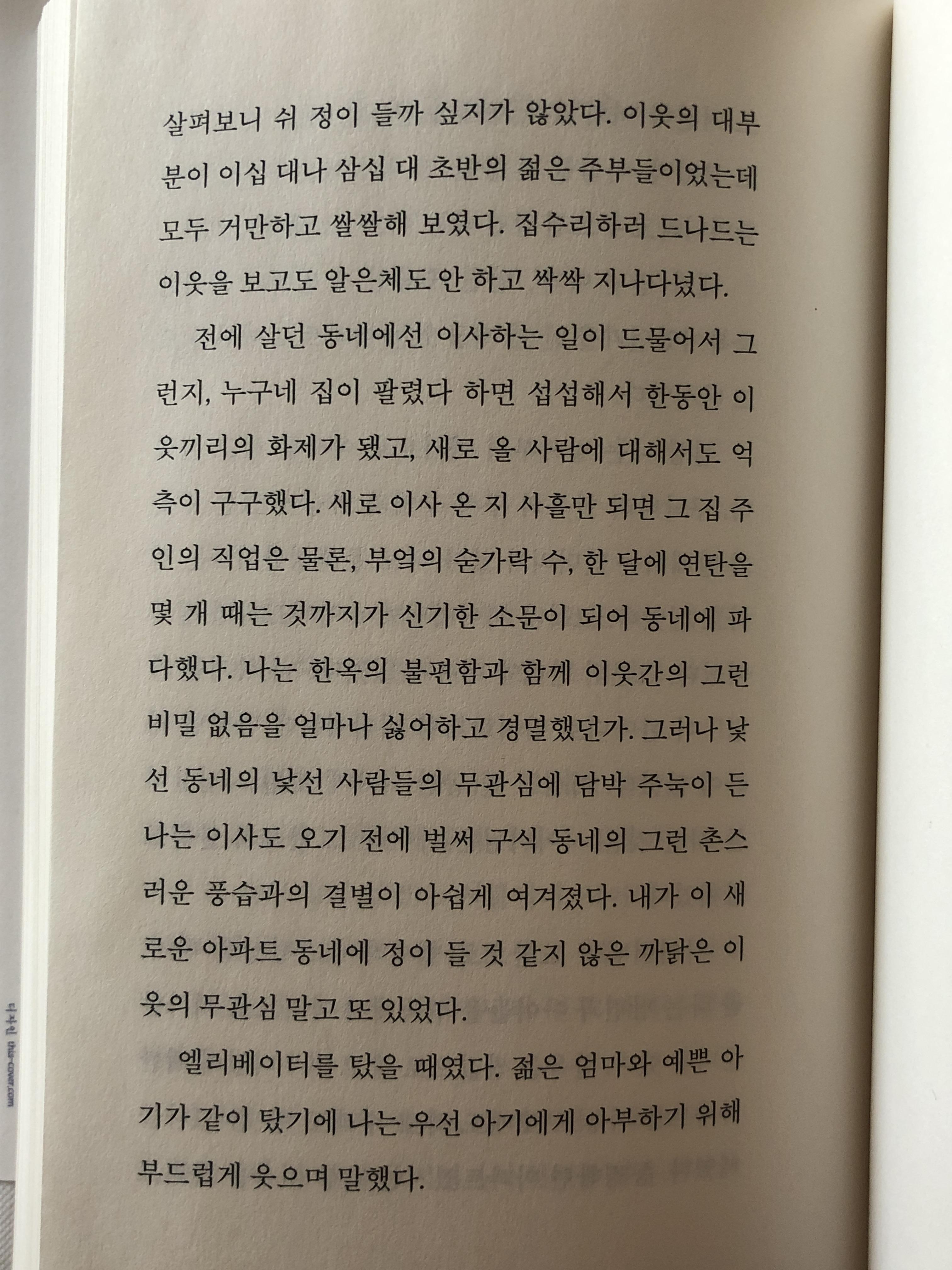
이 책에 아파트와 관련된 내용이 정말로 많이 나온다. 아마 1970년대는 주거형태가 주택에서 아파트로 많이 바뀌는 시기였던 것 같다. 이 소설 속에서 아파트는 부의 상징이자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지만, 막상 이사하고 난 후에는 이웃의 무관심과 쌀쌀맞음에 상처 받는 곳으로 그려진다. 작가가 걱정했던 문제는 현실이 된 듯하다. 고립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도 꽤 지났고 이제 라디오에서는 이웃과 인사하며 지내자는 캠패인 송이 나온다. 하지만 이제는 서로의 무관심에 더이상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. 특히 아이 없는 (아이가 있으면 아파트 내에서도 연결이 많이 생기는 것 같다)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웃의 관심이 간섭이나 불편함으로 다가오지 않나 싶다. 따뜻한 세상.. 좋지.. 좋은데 막상 나라면 이웃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기보다는 서로 민폐 끼치지 않고 적당히 거리 유지하면서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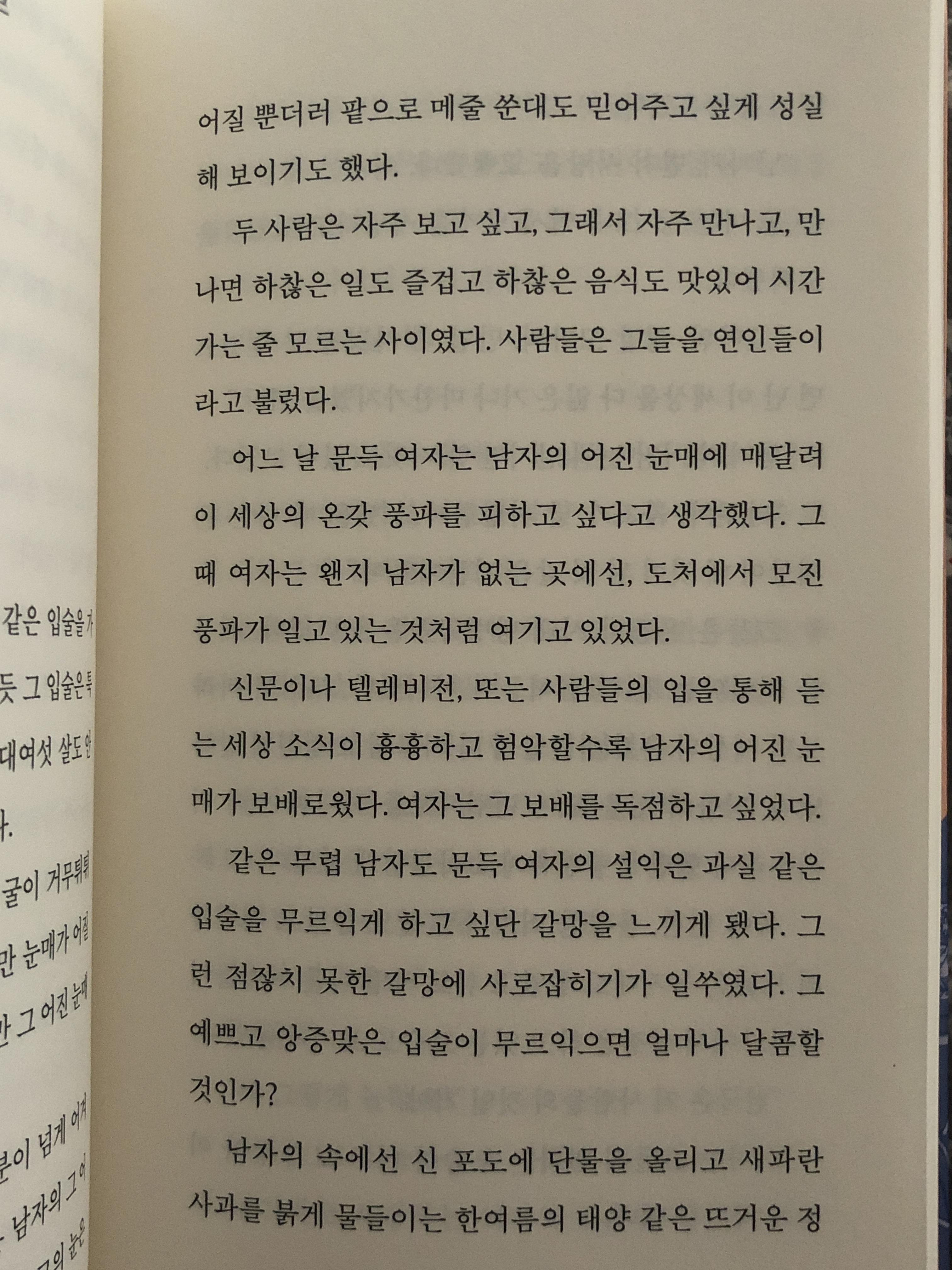
두 사람은 자주 보고 싶고, 그래서 자주 만나고, 만나면 하찮은 일도 즐겁고 하찮은 음식도 맛있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사이였다. 사람들은 그들을 연인이라고 불렀다. p305
담백하고 꾸밈 없는 문장은 자꾸 곱씹어 읽게 만든다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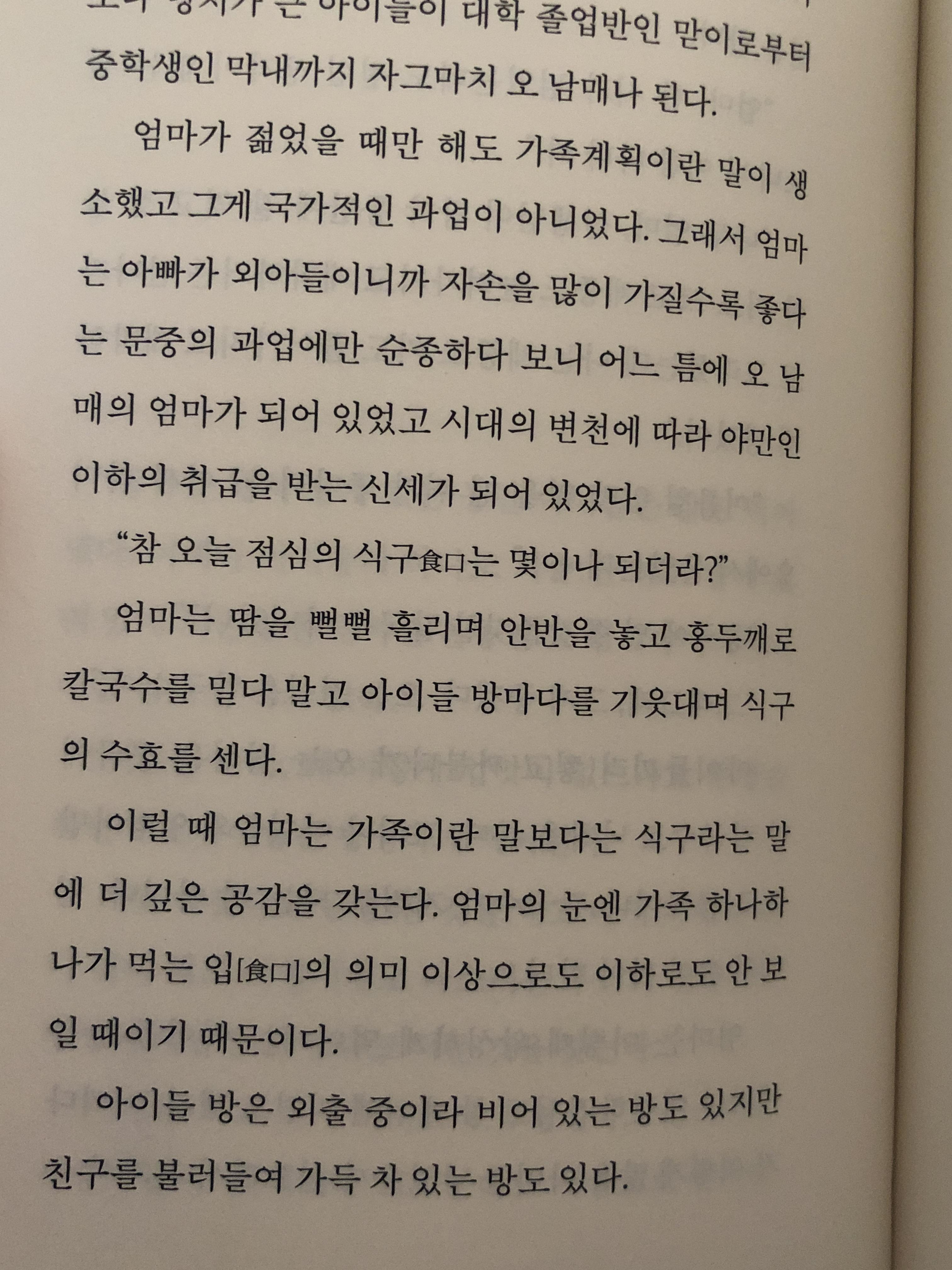
가족과 식구에 대해 생각해본다. 식구라는 말이 가족이 쓰일 법한 문장에서 쓰이는 걸로 보아선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. 밥을 같이 먹으면 가족이라는 거 아니겠나. 그리고 가족이라면, 식구라면 밥을 같이 먹어야겠다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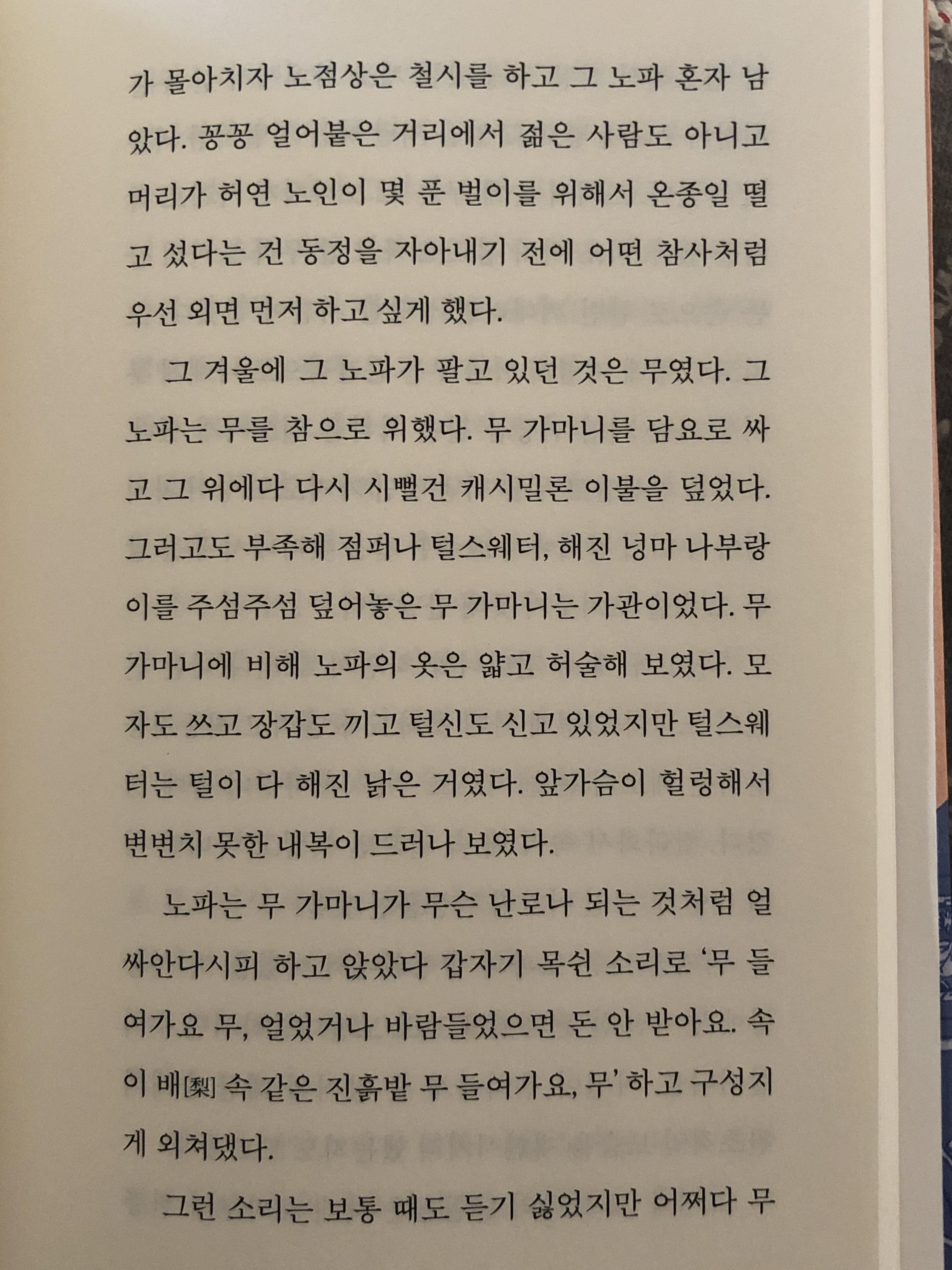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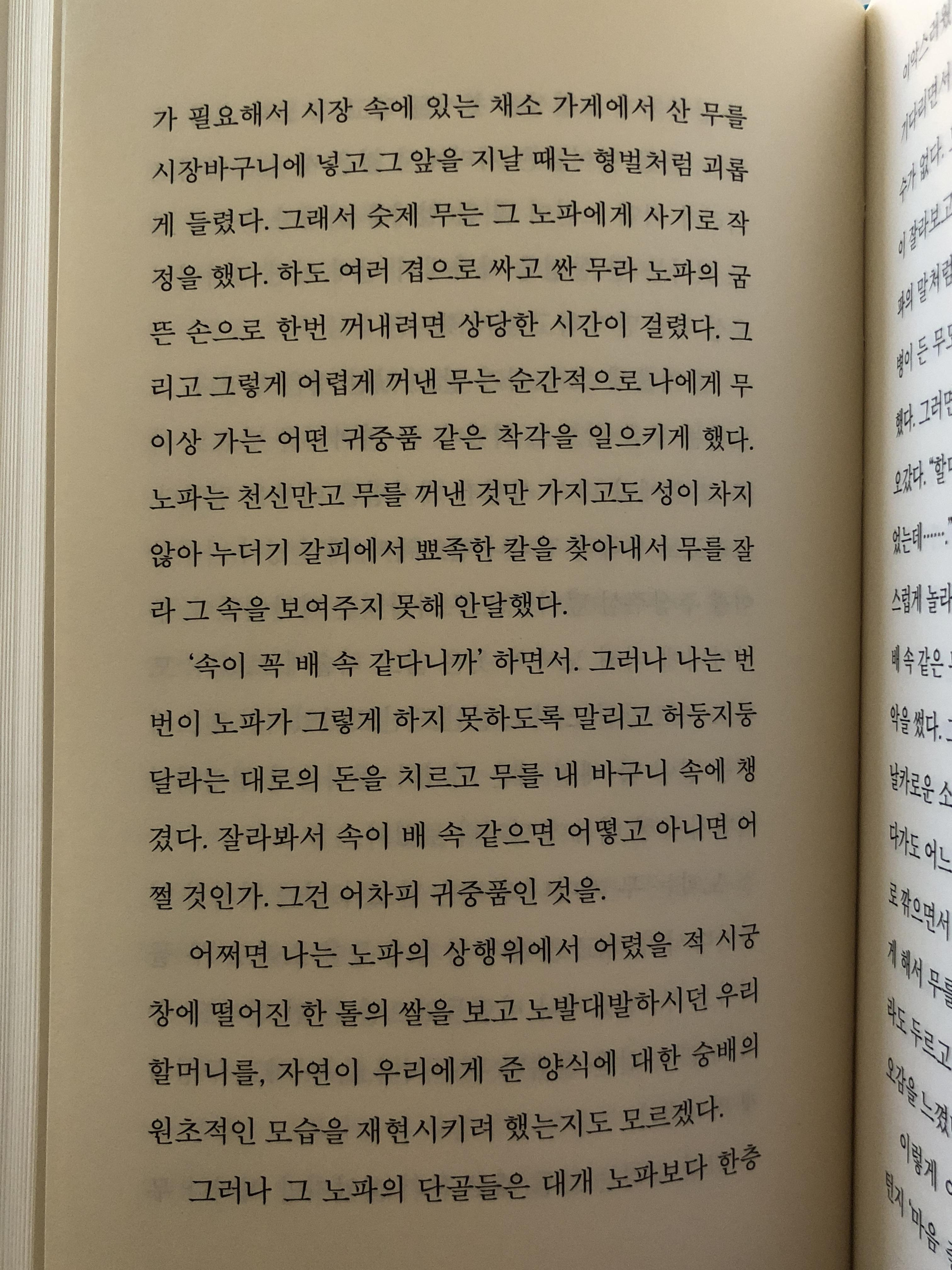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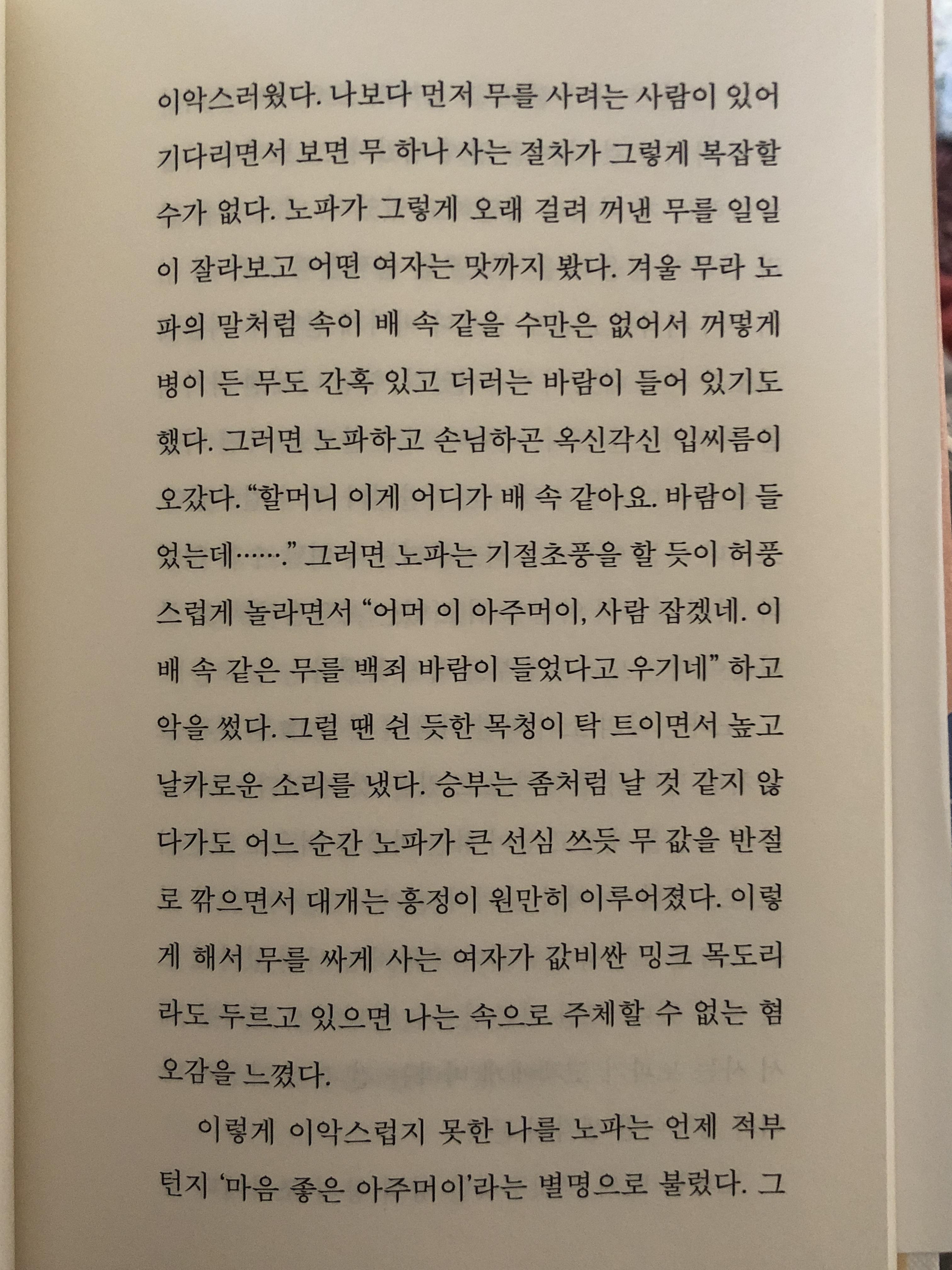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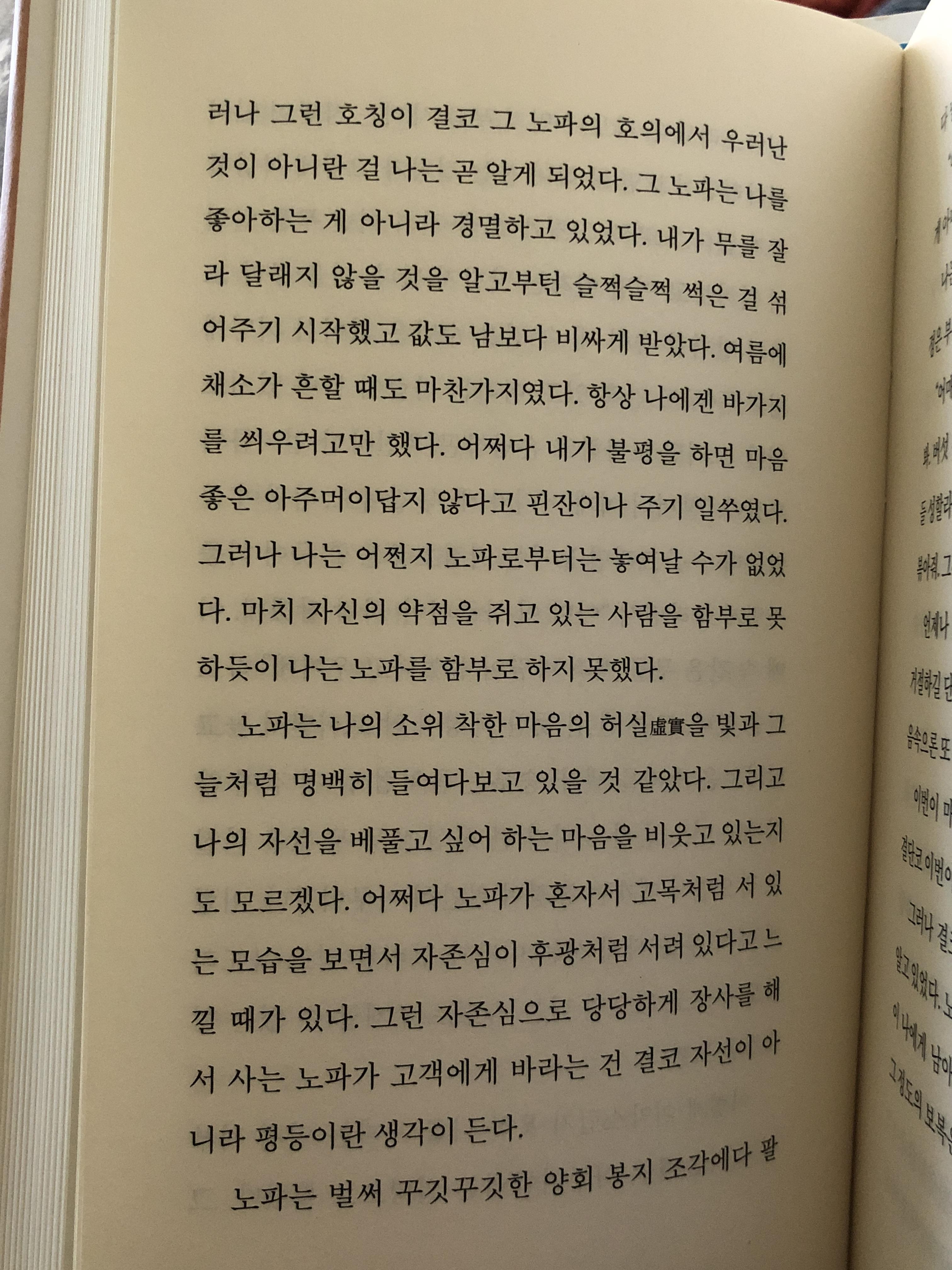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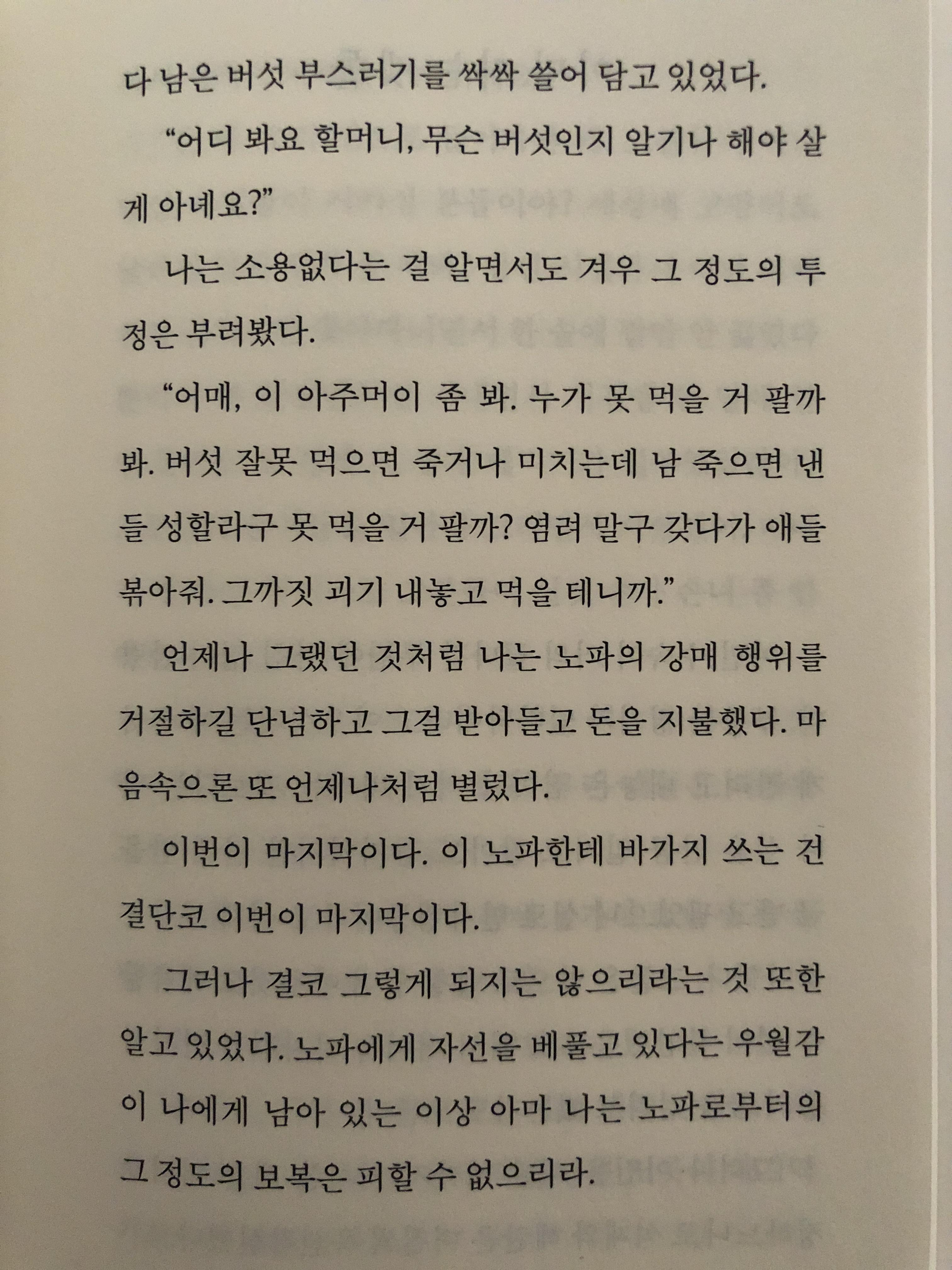
제일 좋았던 단편 <노파>. 읽는 내내 머릿 속에 영화관이라도 있는 듯 영상 지원이 됐다. 추운 겨울 날, 좁은 길목에서 무를 팔고 있는 노파. 본인은 얇은 옷을 입고서도 무가 얼을라 담요, 스웨터, 넝마로 겹겹이 싸놨기 때문에 무를 한 번 꺼낼라치면 노파의 굼뜬 손으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. 노파는 그렇게 어렵게 꺼낸 무를 꼭 잘라 바람이 들지 않았다는 걸 확인시켜주고는 했다. 하지만 주인공은 그런 노파가 안쓰럽다는 생각에 한사코 말리고서 부르는 대로 값을 줬다. 주인공이 무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부터 노파는 슬쩍 슬쩍 썩은 무를 섞어주거나 남들보다 비싼 값을 받았다. 그러면서도 주인공은 노파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없었다. 그 이유가 참 재미있다. 노파는 떳떳하게 장사를 하는 것뿐인데 주인공은 노파에게 자선을 베풀고 있다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. 노파는 주인공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‘보복’한다. 분명 경험해본 적 없은 것 같은데 경험해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소설이었다. 상대가 원치 않는 동정과 연민의 감정, 자선을 베풀고 있다는 우월감은 부끄러운 감정이라는 걸 되짚어준다.
다 읽고 나니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, 작가들이 존경하는 작가로 꼽히는 지 알 것 같다. <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> 추천받아서 빌려놨는데 기대된다!
'책장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2022-6 <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> 박완서 (0) | 2022.01.27 |
|---|---|
| 2022-4 <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> 야마구치 슈 (0) | 2022.01.23 |
| 2022-2 <아비투스 :인간의 품격을 결정하는 7가지 자본> 도리스 메르틴 (0) | 2022.01.09 |
| 2022-1 <인간실격>, <직소> 다자이 오사무 (0) | 2022.01.07 |
| 2021-33 <죽은 자의 집 청소> 김완 (0) | 2022.01.03 |



